2020. 3. 6. 18:47ㆍ책읽기_1주1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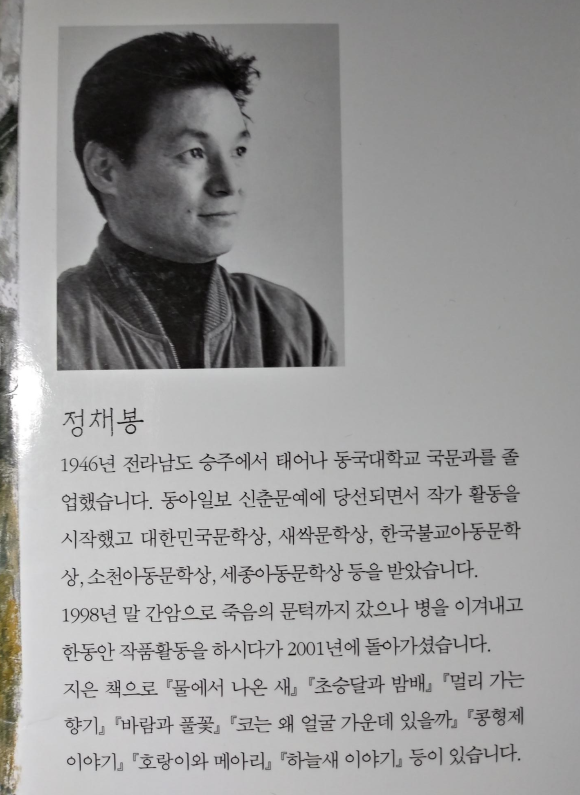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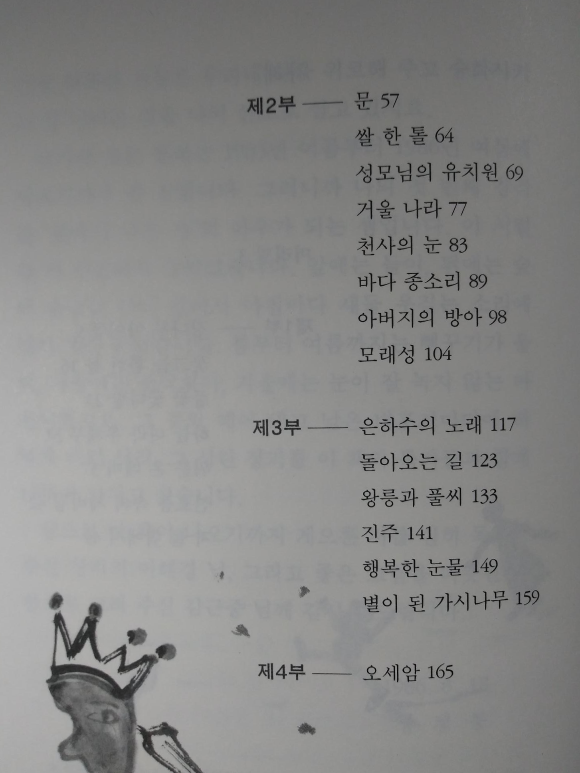
교과서에도 수록된 「오세암」을 비롯, 깊은 산속 맑은 물 같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화들이다. 어린 시절로 돌아가 맑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동화 속 주인공에게 흠뻑 빠져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왔다. 조용한 평화와 기쁨이 뭉게뭉게 부풀어 오른다. 가끔은 두 눈에 맑은 눈물이 솟는다. 소리내어 웃다가 울컥울컥 감동한다. 나도 원래 이런 모습이었을까. 작가의 기대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은 모습일 거다. 아름다운 한 단어 한 문장, 행복한 따라 쓰기를 한다.
- 머리말 중에서-
나는 항상 글쓰기에 앞서 '창세기 1장'에서 거듭 나오는 "하느님께서 보시기 참 좋았다"는 말을 상기하곤 합니다... 피천득 선생께서 하신 말씀입니다만 "문학의 가장 위대한 기능은 우리네 삶을 위로해 주고 승화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나의 신조로 삼고 있지요...
-본문 중에서-
조용한 평화로 뭉게뭉게 커지곤 하지... 넓은 하늘을 온통 내 흰구름으로 가득 덮고 싶은 날이었어....
개울가의 마른 풀잎들이 서걱거렸지. 바위를 도는 물줄기는 돌돌거렸고, 작은 물고기가 한 마리 물 위로 반짝하고 뛰었어...
진달래 꽃빛이 산을 덮어가는 봄날의 오후였지...
고아원, 사실은 낙엽처럼 쓸쓸한 아이들이 모여 사는 서글픈 곳이다...
기쁨으로 가득 찬 내 가슴이 뭉게뭉게 부풀어 오르는 한낮이었어... 나도 기분이 좋아 뭉클뭉클 웃었고.. 아주 신나서 폴폴 다니고..
뜰에 목련이 눈부시게 벙그는 봄날 오후였습니다. 식구들의 웃음이 터졌습니다. 할머니는 틀니까지 빠뜨렸습니다...
저마다 이쁜 얼굴을 하고 모여 있는 꽃밭 교실. 함초롬히 이슬을 머금은 꽃들의 모습은 영롱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어쩌다 밤 사이에 소나기로 샤워라도 한 날이면 옷자락이 스치기만 해도 꽃물이 옮아 올 만큼 싱싱한 꽃나무들.
부처님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 "너도나도 달라고 조르는 사람들뿐이니 참 힘들구나. 사람들은 흡사 내가 저들의 복과 명과 높은 자리를 떼어먹은 빚쟁이인 양 그저 달라고만 하는구나."
저 산과 저 들과 저 강을 보아라. 어느 것 하나 이어 붙이지 않은 것이 있느냐. 저 무리 없는 이어 붙임이 하나로 된 바다보다 아름답지 않으냐." 아버지의 목소리가 목단 꽃잎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내 귀로 굴러들어 왔습니다.
우리 인형들은 나이가 곧 주인의 사랑을 말하여 주지요. 한 살을 먹으면 한 해의 사랑을 받았음이고, 두 살을 먹으면 두 해의 사랑을 받았음이고.
앵무새가 말앴다. "갇혀서 살수록 당당해져야 돼. 땀 흘려서 노력하지 않고 거저먹으려면 못된 유혹에 넘어가서 이렇게 잡혀온 신세가 되었잖아. 이제부턴 배가 고프고 고단하더라도 먹을 값어치 한 대로만 먹고사는 거야. 비굴하게 아부해서 살찌고 사느니보다는 적게 먹더라도 진실되게 떳떳이 사는 삶이 소중한 것 아니겠어?" 앵무새의 두 눈에 달빛보다도 맑은 눈물이 솟았다.
"괜찮아. 우리가 싸우지만 않으면 돼. 우리가 사이좋게 있으면 매운바람도 우릴 비켜 가는 걸."
"아이, 스님도 답답하다. 감이는 그냥 감이라는 뜻이야. 눈을 감았으니까. 그래서 감이야."
"아유 답답해. 누난 내곁에도 지금 있는 거야. 감이 누나가 그랬어. 내가 있는 곳엔 어디고 감이 누나 마음도 따라와 있겠다고."
이래도 가물가물 웃고, 저래도 가물가물 웃는 그림 속의 보살님이 길손이는 마냥 좋았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나는 엄가가 없어요. 엄마 얼굴도 모르는걸요. 정말이어요. 내 소원을 말할게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요. 약속하지요. 내 소원은...... 내 소원은...... 저...... 엄마를...... 엄마를 가지는 거예요. 저...... 엄...... 마...... 엄마......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연기는 곧게 하늘로 올라가서 흰구름과 함께 조용히 흘러갔다.
그리고 능엄이, 자넨 다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네. 자기의 삶을 남에게 평생 의지해 살면 뿌리가 썩어 버리는 법이야. 아마 가뭄이 들거나 큰 물이 질 때도 있을 테니 힘은 들겠지. 그러나 그런 어려움쯤은 견뎌 내야 하네. 그래야 살아간다는 보람이 생기는 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