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1. 18. 07:59ㆍ책읽기+독후감쓰기_1주1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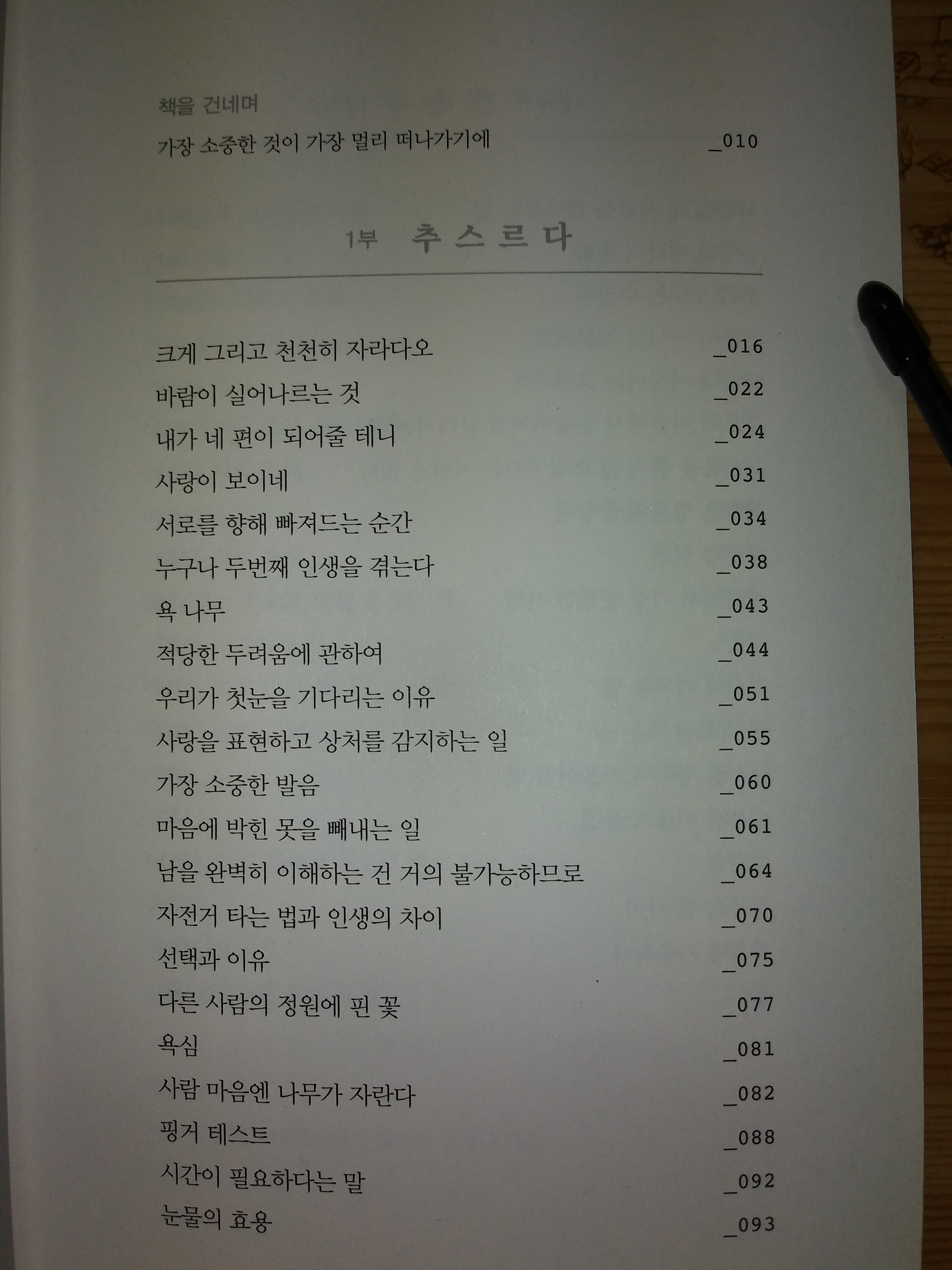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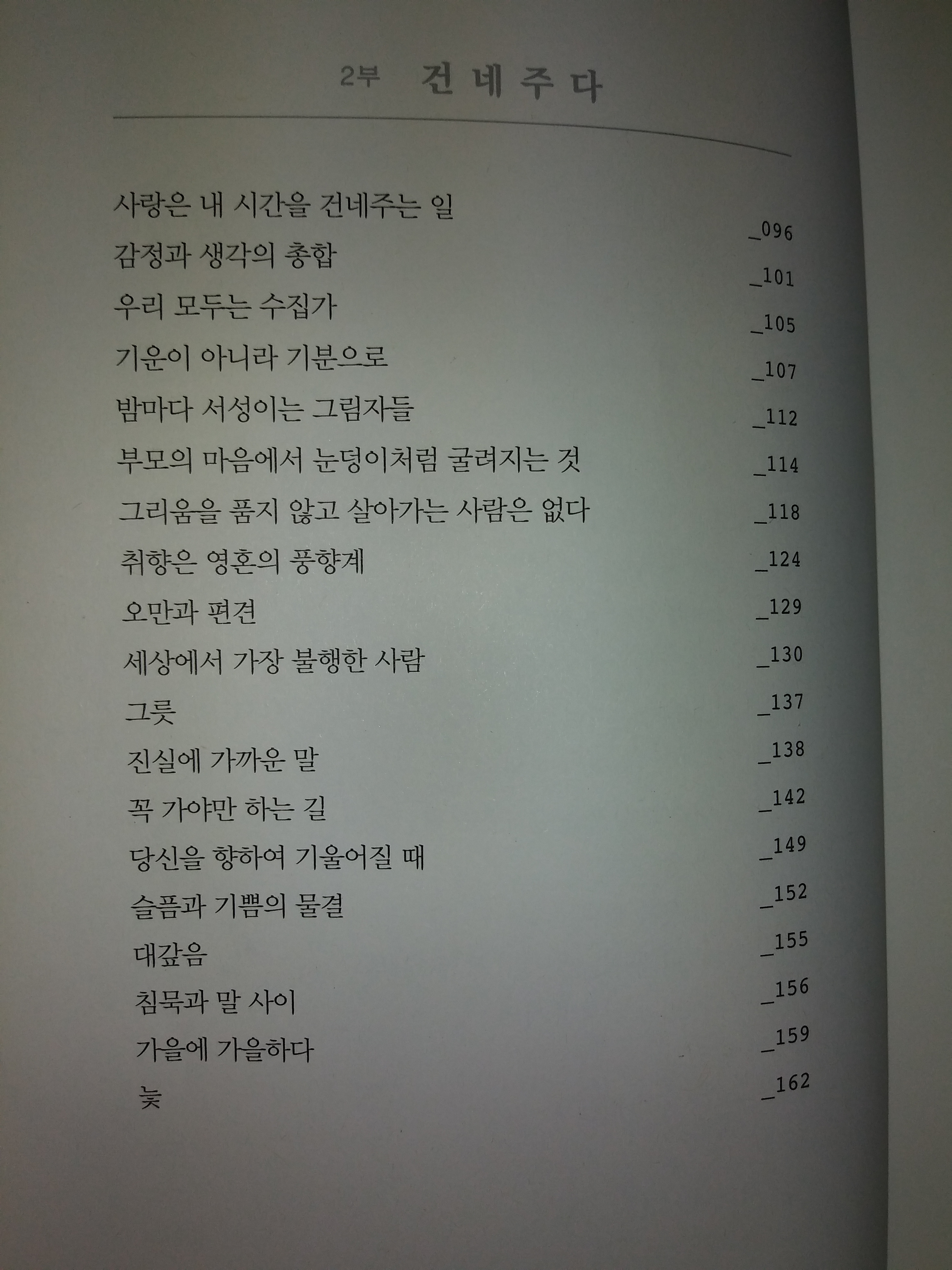

<글의 품격>, <말의 품격>에 이어서 <한때 소중했던 것들>을 읽었다. 가을 들어서 이기주 저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부쩍 많아졌다. 산문집이라서 다양한 주제의 얘기들이다. 역시 생각이 맑고 깊은 저자다. 마음 밑바닥까지 세세하게 헤아리고 만져준다. 저자의 의도대로 공원을 산책하듯이 찬찬히 거닐었다. 상처, 슬픔, 시린 기억 위로 마음에 햇살이 어른거린다. 벌써 <언어의 온도>가 궁금하다.
- 본문 중에서 -
우리가 나이를 먹고 세상을 알아갈수록 스스로 지어 올린 감옥에 갇히는 존재인지 모른다. 편견의 감옥, 자기혐오의 감옥, 두려움의 감옥처럼 그 유형도 다양할 것이다. 그중 가장 경비가 삼엄해서 탈출하기 어려운 감옥은 세상의 모든 것은 희거나 검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라고 간주하는 이분법의 감옥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서로 다른 양쪽의 경계는 아주 밀접하게 맞닿아 있을 것이다. 편견은 주로 무지에서 비롯된다.
희망은 때론 과거에서 온다. 내 과거가 헛되지 않았다는 믿음이 마음 한구석에 꿈틀거릴 때 희망의 싹이 자라기 시작한다. 끄트머리, 라는 단어에는 끝이 되는 부분이라는 뜻 말고도 일의 실마리, 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가끔은 과거의 끄트머리에 걸터앉아 생각과 감정의 속살을 직시하고 자신만의 답을 찾거나, 답이 없음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삶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어떤 희망은 양지와 시작과 미래가 아니라 음지와 끝과 과거에서 생겨난다.
살아간다는 것은 어두운 터널 속에서 자기만의 빛을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걸어가는 일인지 모른다. 빛을 발견하려면 빛만 응시해선 안되지 않나 싶다. 때론 어둠 속을 걸으면서 손끝으로 어둠을 매만져야 한다. 어둠을 가로지를 때 허공으로 흩어지는 어둠의 파편들을 한데 끌어모아, 현미경 들여다보듯 어둠의 성질을 치밀하게 알아내야 한다. 그런 뒤에야 우린 빛으로 향하는 출구를 발견할 수 있다. 어둠을 직시할 때만 우린 빛을 움켜쥘 수 있다.
살다 보면 명백히 늦었음을 절감할 때가 많다. 세월 속으로 저무는 것들을 아무 저항 없이 넋 놓고 바라봐야 하는 순간이 있기 마련이다. 늦었다는 생각이 들면 정말 늦은 건지도 모른다. 다만 세월이라는 강물 위로 소중한 것이 떠내려갈 때 애써 손을 뻗어 움켜쥐려 하기보다, 강물이 그것들을 잘 실어 나르도록 그냥 내버려 둬야 한다... 나이가 먹을수록 절감하게 된다. 시간은 늘 새로운 물결을 몰고 온다는 것을, 인생 하류로 쓸려 내려가는 것들은 갈수록 늘어가지만 내 뜀박질은 점점 느려지고 있음을. 그리고 무언가를 마음에 담아 온전히 간직하려면 온전히 떠나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
스스로 지어 올린 편견의 감옥에 갇혀있을 때가 있다. 내 생각이 상대편 생각보다 더 낫고 옳다고 생각하며 일방적으로 상대를 가르쳐 들려고 한다. 상대의 다른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다. 흑백논리에 익숙하다. 흑과 백의 중간에 있는 다양한 종류의 회색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한 결과다. 가끔은 과거의 어두운 부분을 돌이켜보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내면 가장 깊은 곳을 바라보며 자신만의 삶의 방식을 찾아볼 때 희망이 생길 수 있단다.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어두웠던 부분, 삶의 자국, 마주하기 싫은 상처 부분을 꼼꼼하게 관찰할 때 이를 통해 빛으로 나아갈 수 있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늦었다는 생각이 들 때는 온전히 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다. 나를 세밀하게 관찰한다. 나에게 질문한다. 아직까지 욕심껏 움켜쥐고 놓지 못한 것들이 무엇인지.